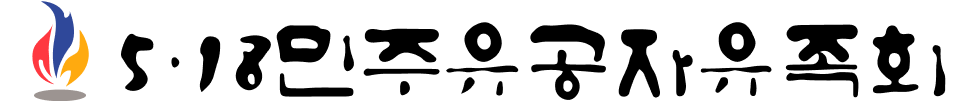
5·18 45주년>"80년 5월 죽음 넘어선 연대, 민주주의 버팀목"(전남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5
조회수 : 117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날은 비록 패배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5000여명의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5·18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됐다. 5·18 유족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5·18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45년 전 5월을 회고했다.
김 여사는 “1980년 5월 27일 도청에 끝까지 남은 아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다. 우리 재학이도 그중 하나”라며 “그때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었다. 5·18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비상계엄이나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시민이 어떻게 연대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을 알려주는 거울이다”고 그날을 기억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비상계엄에 대해 “45년 전 광주처럼, 현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5·18의 희생과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를 넘어 80년 5월이 부활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교수는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그날, 5·18의 기억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날 국회 본청 뒤에 착륙한 3대의 헬기는 마치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일빌딩에 총격을 가한 당시 상황을 연상케 했다.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5·18을 떠올리며 그날의 아픔에 공감했다. 45년이 지난 지금 1980년의 5월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대동세상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계엄군의 폭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가 펼쳤던 연대와 참여의 경험이 현재에 발현됐다고 생각한다”며 5·18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정준,정승우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